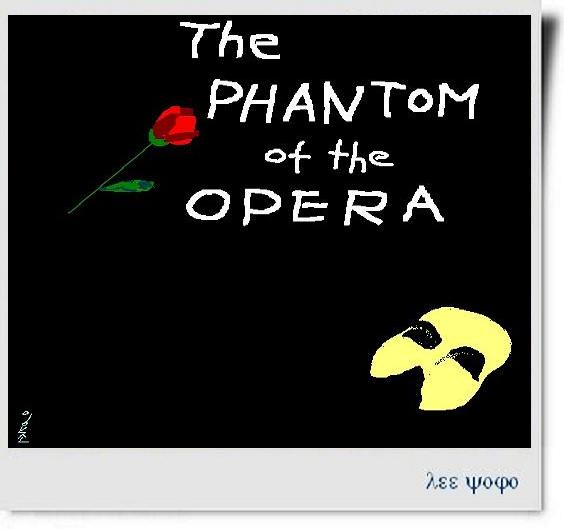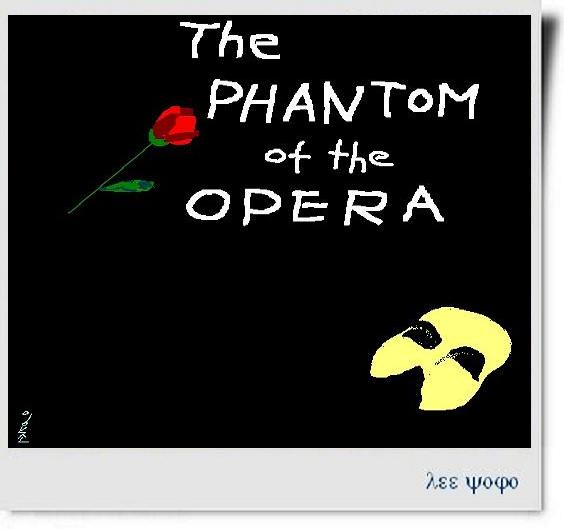초등학교 입학기념으로 미리 받은 통가죽가방!
초등학교 입학기념으로 미리 받은 통가죽가방!
도심지여서 몇 명이나 '란드셀'을 매고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반은 맨 것 같은 생각이다.
(내 동생들 다닐 때 비율을 기억하는 건지?)
책보를 허리춤에 매고 오는 아이들은 시골에서 전학을 오거나
한 반에 한 서너댓 명 쯤?
합반이 아니기에 남학생, 가방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여자애들은 허리춤에다 보자기를 묶어 왔는데...
그들은 숫기가 없어 아예, 어울리려고 마음 접은지 오랜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니..나, 모땐거뜰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통가죽 냄새~~
요즘같지 않은 무두질에 뒷마무리도 그저 그랬는지 유독 냄새가 무지 났었는데도 그 냄새는 나에겐 거의 환상적이었다.
입학식 날만을 고대하며 머리맡에 운동화와 가방을 가지런히 두고서야 어린 나는 잠이 들었다.
물론 잠 들기 전에 가방을 열고 (더 짙은 냄새를 맡으려고)코를 킁킁대다가 운동화 속에다 코를 박고 냄새를 킁킁대다가 그 냄새는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 딛는다(입학?)는 찬란한 내 미래에 대한 무지개빛깔의 냄새였다.
란드셀을 등에 매고 다닐 때는 그냥 걸으면 안되었다.
반드시 달리거나 촐싹대어야만 한다. 학교가 요즘 말하는 산복도로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나는 항상 구르듯이 달려서 언덕을 내려와야만 했다.
뚜껑을 고정시키는 게 없었으므로 무궁화 양각이 볼록하게 박힌 가방 뚜껑은 펄럭거리고
그 안에 든 양철 필통 속에 든 연필은 함께 신이 나서 달그락대는지...
아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건지...아무튼 난 란드셀만 매면 여지없이 달렸다.
그렇게 달리면 신이 날 수가 없었다.
그 필통 속에 들은 '문화연필''동아연필'등은 한 자루 내내 다 깎도록 심은 부러져 나갔다.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나.. 시상식 때 연필의 육각 모서리 한 부분에 글을 새겨주는 것도
그 당시엔 아주 유행이었었다.
지금의 육성회쯤 되는 'XX국민학교 사친회' 라고 새기던가
하는 글씨가 찬란했던 연필들....(아마 글 새겨넣기, 유행은 내가 고학년이었을 때가 아닌가 싶다)
..................
중학교에 가서는 (부산여중)
천으로 만든 가방이었는데... 참으로 그 당시 교복은 지금껏 생각해봐도 쎈세이션한 모양이었다.
겨울엔 자주색 코듀로이 상의에 같은 색감의 코듀로이 베레모, 검은 운동화,
여름엔 푸른 빛 두 줄 앞 주름 A라인 치마에 밀짚모자...흰 운동화,
그 당시 학교엔 신기료 아저씨가 늘 상주해 있었는데...
집에서 아무리 엄마가 깨끗하게 잘 씻어서 연탄불 아궁이에 말려주셔도 누르팅팅했던 운동화를 맡기고는 한 시간 뒤, 수업이 끝나 나가보면 뭘 발랐는지...
눈이 부신 새하얀 운동화로 변해 있었다.
가방은 겨울엔 감색이나 검정 천으로 만든 것,
여름엔 흰 천으로 만든 것,
파는 것은 아주 정교하게 안 감도 넣고 칸도 지르고 뚜껑도 물론 있고 했지만...
난,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것을 들고 다니며 투덜댔다.
물론 파는 가방보단 예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크로바'표 가방 같은 것이 쏟아져서 다른 여중생들은 모두들 그런 가방을 들고
뽐내었지만...
우린 그저 명문이라는..그리고 전통이라는 그 명분으로 감수했다.
그것도 사용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났다.
양쪽으로 책을 빼곡하니 맞추어 넣고는 양가로는 넒은 노트를 넣고는 양 모서리엔 안경집이나 필통을 넣으면 아주 가방이 볼품있게 반듯해 보였다.

근데...
요즘처럼 딱딱한 그런 안경집이
아니었고 스펀지가 약간 들어간
주머니 형태여서 복잡한 전차나
버스에 끼인 가방을 낚아채듯 내
려서 교실에 가서 보면 번번이
깨어져 있곤했다.
얼마나 자주 깨어 먹는지...
엄마는 제발 안경 좀 끼고 다녀
라! 호통이셨지만....
초등 육학년 말 부터 끼기 시작한
안경은 중학생 시절, 당시엔 까만 뿔(프라스틱)테 안경 뿐이었으므로....
고등학생이 되자 희미한 옅은 노랑, 옅은 빨강등 드문 드문 칼라가 든 안경테가 나오기 시작했었다.
|